‘왕오천축국전’은 신라의 승려 혜초가 인도 5국 부근의 여러 나라를 순례하고 그 행적을 기록한 여행기다. 화자 ‘H’는 원문이 사라진 이 책에 주석을 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책 속의 깨진 글자를 찾기 위해 혜초의 발자취를 따라 낭가파르바트(Nanga-Parbat)*를 오른다.
그의 여자친구는 한강에 투신하기 전 마지막으로 ‘왕오천축국전’을 읽었다. 그녀의 죽음 이후 그는 우연히 도서대출증에서 그녀의 이름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과 그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써내려갔다. 그리고 소설에 담지 않은 나머지 일들은 모두 히말라야로 가져가기로 마음먹는다. 그와 여자친구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오직 여자친구의 투신에 논리적으로 부합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문장으로 남겨지거나 버려졌다.
그가 그녀의 자살에 집착하는 이유는 유서 속에 자신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마디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책 속의 깨진 글자를 찾으면 그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는 그녀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생각했거나 혹은 죽는 순간조차도 그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여겼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이라곤 남겨진 글뿐이었다. 그렇게 깨진 글자를 찾기 위해 낭가파르바트를 오르던 그는 등반 마지막 날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기사에 따르면 크레바스(crevasse)**에 빠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틈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그의 문장은 막을 내렸다.
‘왕오천축국전’은 원문이 사라졌으므로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문장은 원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깨진 글자에 대한 그의 집착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틈 속에 그를 가둬버렸다. 인간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와 무관하게 그 대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해하려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오해가 생긴다. 나는 한때 상대방의 모든 걸 이해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 믿었다. 그래서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결국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었다. 이해하려는 욕망은 곧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번져갈 뿐이었다. 주인공이 자살한 여자친구의 흔적을 좇아서 깨진 글자를 찾으려고 설산을 오르다가 결국 크레바스에 빠져 죽게 된 것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우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일에 한평생 몰두한다.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려는 몸짓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끝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문장이 끝나는 곳에서 나타나는 모든 꿈들의 케른(Cairn)*** 옆엔 순결한 사랑이 빛나고 있을 것이다.
*낭가파르바트: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해있으며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높은 산
**크레바스: 빙하 혹은 눈 골짜기에 형성된 깊은 균열
***케른: 돌을 쌓아 만든 이정표 혹은 돌무덤
박지연 기자 10jiyeon@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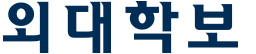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