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누군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 힘을 잃는다. 말이란 행위는 본질적으로 상대를 향해 있기 때문이다. 그 상대가 부재할 때 생기는 특수한 형태를 ‘혼잣말’이라고 부른다. 즉 혼잣말은 일종의 결핍을 전제로 한다. 반면 글은 누가 읽지 않더라도 남긴다는 것만으로 그 의미가 완성된다. ‘혼자글’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다.
말은 양날의 검이다. 상대에게 바로 닿을 수 있는 만큼 그 위험도 크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격언처럼 뜻하지 않은 오해를 남기기도 한다. 반면 글은 내가 생각한 것들을 몇 번이고 다듬을 수 있다. 그렇게 정제된 깨끗한 알맹이를 세상에 꺼내놓는다. 글을 쓴다는 건 단순히 활자를 나열하고 문장을 조합하는 일이 아니다. 내 안의 진심을 세상에 꺼내놓는 일이다. 그 안에는 내가 꺼낸 말과 꺼내지 못한 말이 뒤섞여 있다. 그리고 꺼냈지만 외면당한 말들과 외면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공존한다.
가수 ‘검정치마’의 ‘음악하는 여자’엔 이런 가사가 있다. “가사 말에 진심을 담지마. 사람들은 어차피 못 알아들어.” 이어지는 2절에는 “가사 말에 진심을 담지마. 사람들은 알아도 아는 척 안 해.” 가사에 진심을 담지 말라는 그의 말은 역설적으로 그가 누구보다도 가사에 진심을 담아왔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진심을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두려움 뒤엔 오랜 시간 고민하고 응축해 낸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글쓰기는 역동적이고 난잡한 세상에 나만의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하는 건 세상만이 아니다. 내 머릿속조차 이런저런 생각으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그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정제된 문장으로 내놓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그리고 그 진심이 다른사람에게 닿을 때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울림이 느껴진다.
잔디광장 벚꽂나무에 몽우리가 질 무렵 학보사실로 향하는 승강기에서 마주친 학생들의 손에 학보가 들려있었다. 그 호수에는 캠퍼스 내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와 우리학교 졸업학점 축소에 관한 기사가 실려있었다. 찰나의 순간동안 내 손을 거쳐 간 활자들이 눈 앞을 지나갔다. 나는 학보사실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글은 남긴다는 것만으로 그 의미가 완성되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가 남긴 글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읽힐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검정치마가 가사에 진심을 담듯 내가 글에 진심을 담는 이유다.
외대학보에서 총 세 번의 발행 동안 일곱 편의 기사를 써냈다. 매 기사마다 단어 하나하나 신중하게 써 내려가고 있지만 조판 후엔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더 나은 문장은 없었는지 몇 번이고 곱씹는다. 요즘 나의 가장 큰 고민은 ‘가치 있는 기사’에 관한 것이다. 무엇보다 재학생 입장에서 학내 사건을 보도하는 데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기란 쉽지 않다. 기사는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 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선 거듭 고민해서 써 내린 문장을 다시금 고쳐 쓰며 때로는 포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게 내 바이라인(By-line)이 달린 기사가 누군가에게 전해지길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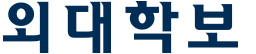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