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02호 기획기사에선 우리학교 소프트웨어(Software) 교육의 지원이 지닌 부족함을 지적하는 기사를 다뤘다. 반면 우리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교육 체계에서의 큰 허점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해 △우리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허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문제
현재 우리학교 학생들은 교양 필수 과목으로 ‘컴퓨팅 사고’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중 하나를 선택해 이수해야 한다. 이 중 ‘컴퓨팅 사고’는 주 2시간의 대면 강의와 1시간의 온라인(Online) 강의로 구성돼 있다. 이때 온라인 강의의 경우 “코드트리(CodeTree)”란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 설계의 허점이 드러난다. 대면 강의에서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오히려 비대면이란 점을 악용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문제 풀이 시 정답을 기입할 수 있는 횟수가 별도로 제한돼 있지 않다는 점과 오답을 기입해도 별도의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단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객관식 유형의 경우 4지선다 형태이므로 이른바 ‘찍기’ 행위를 통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학교 재학생 김강백(공과전자공24) 씨는 “수업을 통해 알게 돼 정답을 고른 과제도 있지만 모르는 문제가 있을 경우 찍어 맞춘 경험이 여러 번 있다”고 밝혔다. 코딩(Coding) 명령어를 만드는 과제 역시 ‘솔루션(Solution)’버튼만 누르면 정답이 공개된다. 비록 “경험치를 쌓지 못한다”는 경고가 뜨긴 하지만 과제 제출엔 아무런 제약이 없기에 사실상 학습에 어떠한 도움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강의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시험방식 또한 문제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응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따라 불공정한 결과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이다. 지난해 이러한 비대면 수업을 수강한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솔직히 수업을 듣지 않아도 나중에 챗지피티(ChatGPT)를 사용해 시험을 보면 됐기 때문에 성적은 잘 받았지만 강의 내용은 모른다”고 고백했다. 이러한 시험 방식은 이른바 ‘시험 중 부정행위’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A 씨는 “주변에 시험시간 중 친구 여러 명을 모아 함께 문제를 푸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하며 우리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허점을 지적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 실질적인 복습 여부를 교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코드트리의 경우 전술한 문제가 있으나 LMS의 경우 별도로 ‘시험’란을 활용해 교수자가 풀이 횟수에 제한을 둔 복습 과제를 제공할 수 있다.
문제 해결 과정이나 코드 작성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심층적인 이해를 평가하는 서답형 문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단순히 교수자가 설정한 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학생의 풀이 과정을 피드백(Feedback) 하는 과정을 통해 앞에 제기된 ‘찍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제 은행식 출제 방식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작위 과제 제공을 통해 각자가 다른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정한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도 해결할 수 있다.
해당 과목들에 대한 강의 방식과 평가 방식을 전면 대면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효과적인 대안이다. 홍익대학교(이하 홍익대) 역시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홍익대의 경우 강의의 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홍익대에 재학 중인 박시현 씨는 “시험은 당연히 대면 형식이 원칙이고 해당 시험 방식이 실제 학습 효과 견인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인식 개선 역시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다. 특히 현재와 같이 교양 필수 과목임에도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성적을 부여하는 반강제적 학습방식은 오히려 해당 과목을 학습의 대상이 아닌 해치워야 할 ‘하나의 짐’으로 인식하게 한다. 실제로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선 “난 문과인데 왜 컴퓨팅 수업을 들어야 되냐”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성적 평가 방식을 자율평가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Pass/Fail 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학생들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우리학교 역시 이에 발맞춰 △소프트웨어△인공지능△파이썬(Python) 등의 수업 체계를 갖추는 중이다.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혁명의 물결에 우리학교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보다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다.
임재언 기자 11jaeeon@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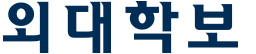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