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보그(Cyborg)가 되다’는 ‘의족이나 휠체어를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을까’란 물음으로 출발한다. 김초엽 작가와 김원영 작가는 각각 청각장애와 지체 장애를 갖고 보청기나 휠체어와 함께하는 삶을 사이보그라는 개념과 연결한다. 그들의 개성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장애를 결핍이나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닌 정체성의 일부로 바라보며 책은 전개된다.
이 책은 비장애인의 무의식적 차별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언젠가 치료법이 개발될 것이다”거나 “장애를 극복하다” 등의 장애인 응원 문구는 당사자에게 대책 없는 희망으로 느껴질 수 있단 것이다. 이렇듯 다수자의 시선에서 해석하는 태도는 혁신적 기술만이 유일한 해답인 듯한 테크노에이블리즘(Technoableism)*으로 빠지기 쉽다. 또한 작가는 사회적 지원의 차원에서도 장애인에게 과연 최신 의료 기술이 최우선인지 독자에게 물음표를 던진다. 예컨대 청각장애인에겐 수어나 문자 통역이 더 실용적임에도 의료 시술이나 로봇 외골격 같은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냔 비판이 있다. 이를 가장 잘 집약하는 문장은 “나는 장애를 고치는 약이 나와도 먹지 않을 겁니다”는 문장이다. 이는 장애를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만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으로 장애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며 있는 그대로 인정받으려는 선언이다. 이 부분에서 모든 장애인이 완치를 바라는 게 아니며 그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로 존중받길 원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며 내가 저번 케이티(KT) 광고에 느꼈던 의문도 명확해졌다. 기가지니(Giga Genie) 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을 홍보하는 해당 광고는 장애인이 기술의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혜택을 받는 자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철저하게 비장애인 관점에서 해석한 광고를 장애인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청능주의’ 연출이라는 단어로 알 수 있다. 작가는 수어를 배워 소통하려는 노력이 아닌 농인이 말하고 듣기를 바란다는 연출이 비장애인의 눈높이에서 해석한 결과라고 비판한다.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지는 장애인 지하철 시위와 함께 비장애인에겐 그들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공존하는 존재이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사이보그가 되다’는 이들에 대한 연민을 부추기는 책이 아닌 당사자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은 책이다. 따라서 주위에 마땅히 이들의 상황을 들을 수 없을 때 혹은 차별인지도 모르고 무심코 지나칠 때 장애인의 입장을 만나볼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테크노에이블리즘(Technoableism): 새로운 기술을 매개로 비장애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현상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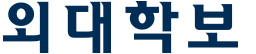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