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 혁에 새로울 신 혁신적인 여자” 중학교 학년말 소개란에 내가 썼던 글이다. 새로운 것을 찾는 걸 좋아했던 난 고등학생 때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공학 연구원이 되길 희망했다. 무언가를 발굴하고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나에겐 새로울 신 활자의 정의였다. 그러나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던 영어학 전공생이 된 후 난 손에 들린 전공책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미 정갈하게 정리된 언어학을 배우며 내 인생에선 더 이상 새로울 신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지나가다 발견한 것이 학교 신문이었다. “신문을 마지막으로 본 적이 언제더라”며 무심코 집어 든 외대학보를 읽으며 매료된 그때 난 대학에서 다시 새로울 신을 발견했다.
기자는 기삿거리를 위해 매일 새로움을 찾아다닌다. 그렇기에 ‘신문’이란 단어는 영어와 한국어 모두 ‘새로움’을 내포한다. 나 역시 기사의 주제를 찾는 것이 가장 힘들지만 동시에 기사 작성에 있어 가장 재미있고 의미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 주제는 수많은 사건 중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주제 즉 새로움을 찾기 위해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듣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기사의 주제로 변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어떤 점이 문제이고 원인은 무엇인지 고려해본다.
외대학보 기자로서 활동하는 것 자체도 나에겐 새로움이었다. 곧 누적 조회수 10만 회를 앞둔 블로거(Blogger)지만 기사를 쓰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블로그(Blog)에선 항상 나에 대해서만 쓰다 보니 기사에도 주어나 목적어를 빠뜨리기 십상이었고 형식과 퇴고 없이 마음 가는 대로 적는 블로그 글관 사뭇 다른 막중한 책임이 있었다. 그렇지만 첫 보도 기사를 작성했을 때 우리학교 일본연구소에서 주최한 행사를 다뤄줘서 감사하다며 연구소 일원 모두 공유했단 답장을 받았을 때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또한 심층 기사를 맡았을 땐 통계청과 관련 기사 인터넷 창을 수십 개 띄어놓고 자료 조사를 했다. 이 기사가 발행된 학보를 펼치는 순간 기자로서 느끼는 보람을 깨달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획 기사는 정말 어려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기획해서 내가 구성을 짜는 글이기에 쓰는 내내 즐거웠다. △교수진△종합정보시스템△총학생회△타 대학 지인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타 대학 홈페이지에 가서 학사 제도와 강의계획서까지 읽었다. 모두 외대학보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전혀 할 수 없는 경험이다.
무언가를 여러 명이 함께 프로젝트형으로 만드는 것도 학창 시절보다 더 나아간 경험이었다. 학보 면접에서 밝혔듯이 난 글쓰기에 있어 0부터 시작하기에 학보 내 선배님들의 피드백은 감사하게 받는다. 여전히 부족한 내 기사를 읽고 매번 정성스러운 피드백을 주신 편집장님과 부장님들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기사도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하나의 기사가 발행되는 데 있어 많은 손길을 거친다. 제안서 브리핑부터 조판까지 혼자가 아니라 모두 함께 이뤄낸 것이다.
어느덧 이번 학기의 절반을 넘어서 학보 활동도 2번만의 발행을 남겨 두고 있다. 비록 반년 동안이지만 어느 대학 생활보다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외대학보 111기 기자 활동이 나에겐 20대 그리고 나아가 인생의 새로운 문(新門)이 되길 바라며 4번째 마감도 무사히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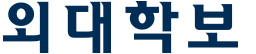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