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리는 오후 흐릿한 흑백 화면 속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다. 최인규 감독의 1949년작 영화 ‘집없는 천사’는 그렇게 시작된다.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란 무거운 시대의 공기 속에서 나에게 순수의 언어를 통해 말을 걸었다. 고아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통해 영화의 메시지가 전달됐기에 나는 이 영화가 그 시대의 참혹함을 잠시 잊게 해주는 휴머니즘(Humanism)을 이야기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영화가 끝난 뒤 나는 그 투명함 너머 정교하게 숨겨진 의미를 발견했다. 바로 식민지 권력이 얼마나 은밀하고 교묘하게 인간의 정신에 뿌리내릴 수 있는지다. 이 영화는 ‘구제’란 이름 아래 조선의 아이들을 황국신민으로 길들이는 ‘교화의 무대’를 충실히 재현한다. 방 선생이 세운 고아원은 피난처가 아닌 제국이 설계한 질서의 실험실이자 조선인의 미성숙한 국민성을 ‘일본적 가치’로 도색하는 정신적 공장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아이들이 그 억압에 스스로 적응해가는 과정이었다. 결말 장면에서 아이들은 일장기 앞에 모여 일본어로 충성의 맹세를 외친다. 교화는 완성됐고 그들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맑은 눈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순수와 세뇌가 겹친 모습이 소름 돋을 만큼 섬뜩하게 다가왔다. 또한 감독은 영화 속에 미세한 파열음들도 숨겨놓았다. 아이들이 함께 국수를 만들고 엿을 나누며 웃는 장면들은 제국이 그리는 이상적 공동체를 상징함과 동시에 조선인의 연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조용한 불협화음이 화면 어딘가에서 분명히 울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대의 기술적 제약은 오히려 그 시대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과장되지 않은 연기△불안정한 음향△촬영 스튜디오(Studio)가 아닌 야외 배경 등 자연 그대로의 요소들은 조선 아이들의 삶을 너무도 진실되게 비춰 관객으로 하여금 더 깊은 감정 이입을 유도한다. 이러한 사실성은 아이들이 황국신민으로 변해가는 순간을 잔혹하리만큼 냉정하게 드러낸다. 나는 그 장면들을 통해 제국주의가 △기억을 삭제하는 방법△일본에 종속되는 방법△연대를 분해하는 방법을 목도했다.
무엇보다 이 영화가 주는 불편함은 내가 그 체제 속에 있었다면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으리란 자각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동화돼 가는 장면을 보며 문득 나 역시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아닐까하는 생각을 한다. 이는 곧 죄책감이 돼 ‘나였다면 그 시대의 동화에 저항할 수 있었을까?’란 질문을 남기게 만든다. 연대는 어디엔가 숨어 있고 권력은 오늘날에도 어떤 이름으로 우리의 순수를 조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이 영화는 그 오래된 세월 속에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응시하고 있다. 천사의 얼굴을 한 이데올로기(Ideology)의 틈새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인간성의 마지막 잔광을 통해 우린 그 속에 묻힌 목소리를 듣고 잊힌 연대를 다시 떠올리게 된다.
최소윤 기자 09soyoon@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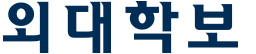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



